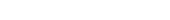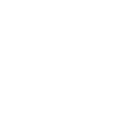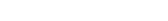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주거의 조건, 거주의 의미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19.10.17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방식 혹은 장소를 우리는 주거(住居) 또는 거주(居住)라 말한다. 협의의 주거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광의의 주거는 무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거주는 집에서 이루어지지만 가만히 삶의 쳇바퀴를 거슬러 짚어보면 우리의 거주는 집과 일터, 이웃과 동네를 포괄하는 하나의 관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존재론을 연구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거주(dwelling)’란 단어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맞는 삶의 방식을 논한 바 있다. 거주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고 돌보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때 거주함은 단순히 인간이 한 공간 속에 있음(머무름)이 아닌 인간 본연의 존재가 세계(자연)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진실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그 관계를 파수해 낼 때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서양 철학자의 난해한 구절이라 하기에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거주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삶, 주거, 집, 거주하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진정 거주할 수 있는 터는 자연이라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오지로 달려가 숨어 살라는 뜻이 아니었을 것이다.
진정한 거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진정한 사유라 한 그에게 자연은 정중동(靜中動)의 흐름 속 우리 존재에 오롯이 집중해 그 울림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공간은 이런 ‘존재의 사유’가 종식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거주를 상실해 갈 뿐이라는 하이데거의 결론은 철학자가 아닌 우리에겐 매우 현실적이고 즉물적인 질문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진정한 거주의 가능성이 희미해져 가는 현대사회의 일원으로서 독자들에게 스스로의 존재는 어떠한 환경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성찰이 비록 하이데거의 ‘자연’에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주거에서 한걸음 나아가 존재의 울림에 충실한 곳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가격, 부동산 추이, 아파트 브랜드, 학군, 역세권, 인지도, 교통입지. 우리가 찾는 주거의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거주를 황폐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뒤돌아 보길 바란다. 그 어떤 국가, 사회보다 건축을 삶과 문화로 바라보지 않는 한국. 오히려 그 어떤 국가, 사회보다 건축을 부동산 가치로만 바라보는 한국에서 존재 그리고 삶의 방법을 매개하는 진정한 거주의 장소를 찾아가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 거주에 대한 왜곡이란 보편성의 틈에서 존재를 사유해 가는 소수의 용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