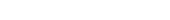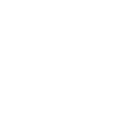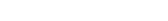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벽돌예찬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19.11.01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필자는 벽돌로 설계하길 즐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허락한다면 디자인 과정에 있는 건축물에 벽돌을 입혔을 때의 모습을 가장 먼저 상상하곤 한다. 석재, 금속재, 페인트 등 수많은 외장재가 있지만 고민 끝에 고르게 되는 재료가 그 흔한 벽돌이라니, 이런 건축가의 선택에는 분명 벽돌이라는 재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터다.
근대건축의 거장 루이스 칸(Louis Kahn)은 강연 중 이런 말을 남긴다.
“벽돌아, 넌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아치(arch)가 되고 싶어요.”
“음, 아치도 좋지만 아치는 비싸단다. 내가 보를 만들어 그 위에 널 얹어줄게.”
“하지만 저는 아치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치를 만들어 보자꾸나.”
이 이야기는 루이스 칸이 ‘모든 재료는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소개한 일화다. 벽돌이 아치 형태를 구축하며 아름다움이 배가되듯, 재료마다 그 본질을 표현하기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구조나 형태가 있다는 뜻이다. 그가 수많은 재료 중 ‘벽돌’을 예로 들며 재료의 본질을 가르쳤다는 것은 벽돌이란 재료가 가지는 특성이 매우 단순 명쾌하기 때문일 것이다.

벽돌의 본질은 ‘쌓음’에 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건축물의 재료들을 살펴보자. 벽돌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석재와 금속재 판넬의 경우 표면은 평활한 면을 형성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철물로 붙들어 매어 콘크리트 벽 위에 고정돼 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 역시 건물 콘크리트 표면에 접착제로 붙인 재료다. 즉 이런 면(面) 재료들은 한 번에 넓은 표면을 형성해 주는 대신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한 셈이다. 인간의 기술이 자연의 섭리를 이겨 내는 현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범하는 작은 실수들이 사고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벽돌은 ‘붙이는’ 재료가 아닌 ‘쌓는’ 재료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중력에 서로를 의지하며 놓이고 또 놓인다. 게다가 널찍한 석재나 금속재처럼 한 번의 시공으로 넓은 면을 형성할 수 없어 한 장, 한 장을 제대로 쌓지 않으면 선이 비틀어지는 것은 물론 안정성까지 상실하고 만다. 또 한 번에 1m 높이 이상을 쌓을 수 없고 쌓아 놓은 벽돌들이 서로 단단히 붙잡고 설 때까지 기다려 준 후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예민한 재료기도 하다. 벽돌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재료이자 정성이 필요한 재료다.
이런 벽돌의 성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많은 건축가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한국의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김수근 건축가는 ‘건축은 빛과 벽돌이 짓는 시’라고 정의하며 벽돌을 실용과 예술이라는 건축의 본질을 살리는 재료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비단 거장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 벽돌 건물이라는 점은 벽돌이 건축가들에게 친숙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재료로 각인돼 있다는 증거다. 특히 황토가 많이 나는 우리 땅의 특성상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잠깐의 도시 산책으로도 저마다 멋을 낸 다양한 벽돌 건축을 접할 수 있다. 세워서 쌓거나 비워내며 쌓기도 하고, 반 토막 내 깨진 면을 드러내 쌓거나 아치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같은 듯 다른 개성 있는 벽돌 건물의 표피는 우리 도시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언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아기자기한 벽돌의 미학을 즐길 기회는 점차 줄어들지도 모른다. 숙련된 벽돌 장인들을 섭외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적(벽돌쌓기) 기술을 가진 국내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해외 기술자들로 대체되며 소통이 어려워진 점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들 한다. 건축가가 개성 있는 벽돌 디자인을 제안해도 기술자와 감독자의 원활한 소통 없이는 구현이 쉽지 않다. 게다가 남아 있는 벽돌 건물들 마저 ‘오래된 것’ 이기에 ‘버려야 할 것’으로 치부되는 우리 부동산 정서상 옛 장인들이 멋스레 쌓은 벽돌 면들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흔한 풍경이지만 한걸음 다가가 들여다보면 고유한 패턴과 형태를 가진 주변의 벽돌 건물들, 일상의 길 위에 벽돌 건물들이 발견된다면 한 번쯤 시선을 던져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