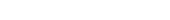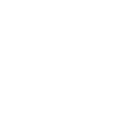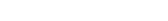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4미터의 올가미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19.11.21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얼마 전 필자에게 신축 설계를 문의한 한 예비 건축주가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오래도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 온 구옥이 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새로 지어 볼 준비가 됐기에 신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만의 역사가 있는 이런 땅은 건축가에게도 즐거운 프로젝트가 될 터 흔쾌히 검토를 진행했다.
한눈에 봐도 몇십 년씩 이웃사촌으로 지내 왔을 이웃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골목. 안타깝게도 그 땅에 닿아 있는 도로는 2m가 채 안 됐다. 건축가가 전할 수 있는 말은 ‘현행법상’ 신축이 어렵겠다는 말뿐이었다. 수십 년을 잘 살아온 땅인데 신축은 왜 안된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지만 아쉬운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 밖엔 방도가 없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직장 탓에 서울을 벗어날 수는 없고, 아내와 딸과 함께 작은 협소주택을 지어 살고자 한 가장과의 만남이었다. 서울시 내에서 자투리땅을 뒤지고 뒤져 예산 내에서 매매 가능한 땅을 어렵사리 구해 건축가와 함께 최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대지에 면한 도로가 3m가 채 안 되는 골목길에 위치했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추후 이 골목길이 ‘4m’로 확장될 것을 가정하고, 4m 도로 확장선까지를 도로로 내놓고 지어야 한다. 10㎝가 소중한 협소주택 부지에서 도로에 면한 쪽을 모서리를 1m 가량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신축에 불리해지는 현행법의 문턱 앞에 가족의 보금자리 꿈은 멀고도 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건축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도로의 조건’ 때문이다.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라는 도로의 정의는 4m가 채 안 되는 모든 부지의 건축행위를 가로막고 있다. 정의의 문제점은 도로의 조건을 ‘차량’에 맞추고 있다는 점인데, 한걸음 더 들어가면 결국 모든 대지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주차’를 개별 대지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주차장법의 일률적 규제에 기인하기도 한다. 도로의 정의가 ‘새로 건물을 짓는 모든 땅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주차장에 닿기 위해 차가 원활히 통행해야 한다’는 점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도로의 폭이 넓어야만 집을 짓게 해 주는 모양이 됐다. 도시와 건축물을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으로 보기 보다 ‘차량’ 위주의 효율적, 기능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 법의 후진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단면이다.

오랜 시간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존재해 온 작은 골목길들은 사람 사는 맛과 추억을 담는 커뮤니티의 중심지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오랜 도시공간 대부분이 이런 골목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 되어 버림으로써 그 골목길에 면한 많은 땅들이 수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 아파트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을 찾아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려 땅을 물색하는 젊은 층은 결국 좌절하고 다시 공급주택 입주에 내몰린다. 또 대대손손 살아온 내 땅에 집을 새로 지어 역사를 이어가려는 기존 주민들도 하염없이 ‘재개발’이나 기다리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 모든 것이 사람 중심적이지 못한 법의 한, 두 문장에서 파생된 문제들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서울시에서 4m 미만의 도로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전국 어디보다 밀집된 노후 골목길이 많은 서울시가 앞장서 관련 법의 정비에 나선다면, 우리의 골목길들도 수명을 다해 죽음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자투리 국유지들을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에서 각 가정의 의무 주차장 수를 갈음할 수 있는 범위의 대지들은 도로 폭에 관계없이 신축을 허용할 만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마을의 골목과 맥락을 보존하게끔 유도하는 이 같은 방식을 시행 중이다. 가족들이 나만의 집을 또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듯이, 수십 년 수백 년 된 골목의 주민들이 골목마다의 분위기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