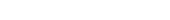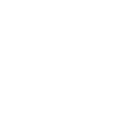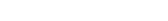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잃어버린 건축 그리고 간판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20.01.13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건축가로서 설계 의뢰를 받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해 볼 기회이자 다른 이의 삶을 공간과 엮어 안착시킬 즐거운 공부의 기회다. 세상의 눈에는 속된 말로 ‘시시해 보일’ 수 있는 건축물조차도 고유의 아름다움을 치열하게 찾아낸다면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결과물로 이 땅에 서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를 받는 순간부터 걱정과 고민이 꼬리를 무는 유일한 유형의 건축이 있다. 근린생활시설, 흔히 상가건물로 불리는 건축물이다.
대중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는 상가건축을 설계한다는 것은 건축가의 공간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가를 계획할 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다. 아무리 고민해도 대책이 없는 바로 ‘간판’이다. 건축은 공공건축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유재산임에도 공공공간에 노출되고 접속되는 공공재라는 이유로 복잡한 허가와 심의를 받는다. 하지만 애써 다듬은 건축에 부착될 간판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건조물인 데 반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오죽하면 혹자는 한국의 상가건축은 간판의 지지대, 부착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건축가의 고된 작업의 종착역에 간판으로 뒤덮인 괴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애써 디자인할 필요 없지 않나 하는 회의감은 필자 역시 피할 수 없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지난 200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문화 창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간판문화는 예외다. 이는 견디기 힘든 시각적 폭력이고 폭력은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한다. 정부는 이런 무질서와 폭력을 다스릴 의무와 힘이 있다.”

건축을 어지럽게 뒤덮은 온갖 자극적인 문구와 조명이 난무하는 간판. 먹고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경제적 부산물로 치부해 외면하기에는 이미 꽤 심각해진 사회문화적 문제이다. 더 크게, 더 많게, 더 튀게 달아매는 간판 경쟁은 과거 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실책의 결과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한 공적 규율은 전무했다. 이미 ‘도시공간의 내피’이자 ‘건축공간의 외피’인 건축 표면은 곪을 대로 곪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 간판 하나하나를 공공디자인으로 해석하고 심의하는 몇몇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간판 도시’는 공공 디자인에 대한 공적 개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후 ‘사후 약방문’을 한 사례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소위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하며 모든 간판을 같은 글씨체와 같은 규격의 간판으로 교체했다. 이 같은 사업은 되레 전례 없는 ‘디자인 획일화’의 대표적 사례로 오명을 쓰게 됐다. ‘사업’으로 접근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설치되자마자 ‘또 다른 간판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간판 개선 사업은 우리 정부가 간판 공해에 대해 근본적 문제 인식과 행정적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됐다.
시선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체다. 모두가 그 관계의 권력을 잡기 위해 시선의 우위를 점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그 욕망이 공공공간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조정하고 통제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수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다. ‘시선’이라는 권력을 탐할 자유의 보장, 우수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공적 이익으로 환원해야 할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주체는 바로 공권력이다. 도시화율이 이미 90%를 넘어선 한국, 우리의 시선은 간판이 아닌 다른 도시공간을 즐길 자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