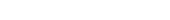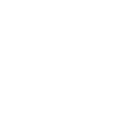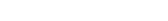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숫자 너머 공간의 의미, 협소주택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20.01.22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 최소의 공간에 다양한 공간감이 펼쳐지는 주택으로 평가받는 건축가 Ando Tadao의 협소주택 Azuma House, 1976
(ⓒ사진. 위키피디아)

△ Ando Tadao의 협소주택 Azuma House, 1976 (ⓒ사진. 위키피디아)
한 층의 바닥이 30㎡, 즉 10평이 채 안 되는 초소형 주택. 이런 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 배경에는 주거공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깔려 있는 듯하다.
협소주택은 사회의 ‘틈’에 자리한다. 주거공간에 대한 기존 관념과 환경의 빈틈을 파고든 집이기 때문이다. 우선 협소주택은 물리적으로 도심의 자투리땅에 비집고 들어선다. 또 나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욕망과 도심 생활권 모두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의 삶의 틈새를 꿰찬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량 공급주택의 획일적 공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과의 간극에 대한 회의가 협소주택 열풍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19년 12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8억 원으로, 대형 단지에 들어서면 평균 8억 원짜리 집이 겹겹이 쌓여 사방으로 늘어서 있는 셈이다. 가끔 필자는 눈앞의 풍경에서 ‘건물’을 지워 보는 상상을 한다. 모두가 같은 곳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삶은 표준화되고 행위는 획일화된다. 이는 하나의 거푸집으로 찍어 쌓은 아파트의 태생적 한계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우스운 집에서 우리는 마음껏 노래를 부르지도, 뛰놀지도 못함에도 심지어 같은 방식의 삶을 너무 쉽게 허락하고 있다. 몰개성의 집에서 살아온 이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바란다면 과욕일 것이다. 결국 숫자로 계량된 다른 가치들에 짓눌려 우리는 자유로운 삶과 열린 사고의 가능성을 아파트에 가두어 두고 있는 꼴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협소주택의 열기는 이러한 획일화된 주거문화에 대한 자각이자 반발이다. 주택을 재산 불리기의 수단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가족의 몸에 꼭 맞는 맞춤복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책자를 보고 고르는 집, 수만 명이 서너 개 타입의 모델하우스에 몰려가 고르는 집이 아닌 가족의 생활 양식과 행동 패턴을 고민해 만들어 내는 ‘인생 플랫폼’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작다’라는 양적 문제보다 ‘몰개성’이라는 질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먼저 생각하는 이들에게 협소주택은 도심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삶과 공간을 구체화하는 해답이 될 수 있었다.
우리 사회 특히 기성세대들에게 집은 아직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찍어져 나온 제품들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듯 대량 공급된 아파트에서 형성된 우리의 정서와 감정은 특별할 수 없다. 면적과 가격이라는 ‘숫자’를 가지기보다 나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삶’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이는 다양한 모습의 ‘집’은 풍성한 도시경관뿐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개성과 창의성을 담보하는 작은 거점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