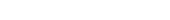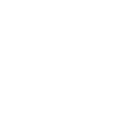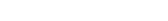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통치에서 공존으로, 주민센터의 진화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20.04.16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 서울시 구로구 한 주민센터 앞에 동주민센터 현장 복지전용차량인 ‘찾동이’가 주차돼 있다. (ⓒ 연합뉴스)
‘찾동’이라는 두 글자를 붙인 차량이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찾동은 2017년 초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체 자치구에 확대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줄임말이다. 주민이 관청을 찾아가는 구도가 아닌 관청이 주민을 찾아간다는 콘셉트로 낯설지만 재미있다. 찾동 뿐 아니라 성북구 안암동에 새로 지어진 안암동 복합청사는 최초의 ‘인권 청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설계단계부터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주민들이 참여해 지어낸 첫 공공건축에 ‘인권’이란 단어를 붙인 것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 곳곳에는 노후한 옛 동사무소 건축물을 민간자본이 투자된 복합청사로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한데 엮여 운영될 날을 예고하고 있다.

△ 안암동 복합청사
이처럼 시민들의 지근거리에 있는 공공건축물인 동주민센터의 변화가 심상찮다. 앞다투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과의 거리를 줄이려는 공공건축, 그중 대표적인 관청 건축의 변화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가장 보수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관청이 변화의 흐름에 직면했다면, 그 이면에는 이를 이끌어낸 또 다른 무언가가 더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들의 위상은 빠르게 높아졌다. 중앙정부 시절 통치와 관리의 대상이던 시민들은 새로이 출범한 각 자치단체에게는 주요 고객(client)으로 주목받았다. 자치단체는 더 이상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다 쓰는 곳이 아닌 스스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 직접 관리하고 지출하는 주체로 떠올랐다. 그만큼 시민들의 이목도 집중됐다. 결국 지역마다 시민들과 민감한 관계에 놓이면서 이른바 ‘자치 복지’의 시대를 열었다. 이는 건축 계획 측면에서도 공무원 위주의 ‘업무공간’에서 시민 위주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990년 이후 초고속 통신망의 보편화와 전자정부(e-gov)의 시행은 공공업무 중 ‘서류 업무’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킨다. 시민들은 소위 ‘서류 떼러’ 관청을 갈 필요가 없어졌고, 관청에는 더 이상 서류 업무와 문서 보관을 위한 공간이 필요치 않게 됐다. 이같이 뜻하지 않은 빈 공간의 출현은 앞선 ‘자치복지’ 시대와 맞물리면서 관청 건축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의료, 문화, 편의시설이 도입되며 생활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옷을 갈아입게 됐다.
이처럼 시민권 향상과 정보통신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변화는 주민센터의 시스템뿐 아니라 공간환경까지 변화시킨다. 1990년대 이전 주민센터의 전신인 ‘동사무소’는 그 명칭 자체가 뜻하듯 하나의 ‘사무소’였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그에 비례해 늘어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서류민원만을 처리하는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동사무소는 2007년부터 ‘주민센터’로 개칭하며 업무시설의 틀을 벗어던졌다. 주민센터의 건립에 설계공모를 도입한 것 역시 이 무렵이다. 더 이상 좌우대칭의 차갑고 권위적인 디자인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공공건축에 민자개발을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주민센터를 만나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동네 곳곳에 위치한 주민센터의 변화에는 이러한 사회사가 담겨 있다. 과거의 통치자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다면, 공권력이 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관청에 모여 운동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시설 개선’ 너머로 공공건축의 변화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상징함을 기억해야 한다. 집 앞 자그마한 주민센터가 높아져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위상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거임을 이해한다면 공공건축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