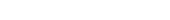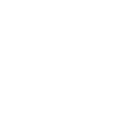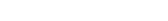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색칠공부와 아카펠라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20.05.05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 서울 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우리들의 도시는 왜 재생의 대상이 됐을까.
또 우리는 어떤 도시를, 어떻게 재생시켜야 할까.
색칠공부 도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색칠공부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도형이나 사물을 여러 면으로 분할해 ‘하나에 하나씩’ 서로 다른 색을 칠해 나가는 놀이다. 그동안 우리가 도시와 건축을 다뤄 오던 방법은 색칠공부와 유사하다. 20세기 중반부터 이어진 급격한 개발의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도시는 하나의 기계가 됐다. 도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선택되어 왔다.
기존의 도시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계획가들은 책상 위에서 도시를 여러 영역(Zoning)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영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지역, 업무지역 등 하나씩의 역할을 부여했다. 기존 도시의 공간적 맥락은 소거됐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누어져 패턴화됐다. 색칠공부처럼 다들 한 영역에 모여 잠을 잤고, 한 영역으로 옮겨가 놀았다. 다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일을 하다가 또 옆 영역에서 쉬었다. 계속해서 영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도시의 특성상 아이들은 걷기보다 자동차가 익숙해지고 세계에서 대중 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된 도시가 됐다. 색칠공부 도시개발은 당시 우리의 성장 속도에 발맞출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사를 가진 한국의 도시들이 요즘 ‘재생’의 대상이 되어 들썩거린다. 결과론적으로 개발의 시대에 그 역할을 다한 도시들은 시대를 넘나드는 지속 가능성을 갖지 못했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건축, 그리고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카펠라 도시
도시공간 자체로 관광자원이 되는 도시들을 걷다 보면 필자는 아카펠라를 듣는 듯한 공간감을 느낀다. ‘하나에 하나씩’ 임무를 받은 도시가 아닌 ‘하나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쌓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지하와 저층에 상점과 카페, 중층에 작은 사무실과 병원 혹은 갤러리, 상부에 주택이 쌓여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있으니 주변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몇 발짝 걸어 나가면 카페, 약국, 식료품점, 정육점, 병원이 있고 틈과 틈 사이로 작은 광장과 공원이 반겨 주니 자연히 보행중심 동네가 만들어졌다. 차량은 최소화되고 걷기 좋은, 또 걷고 싶은 도시가 돼 온 것이다. 화음을 쌓은 도시는 이처럼 자생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며 그 모습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우리 도시들은 색칠공부에서 아카펠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에 놓여있다. 먼 훗날 우리의 건축사(史)를 돌아본다면 21세기 초의 시대정신은 ‘재생’으로 정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거창하진 않더라도 쇠퇴한 도시에 대한 해법이 ‘제거’에서 ‘활성화’로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기임은 분명하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패턴과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에 가장 좋은 도시는 또다시 재생시켜야 할 필요가 없는 도시가 아닐까. 오래도록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늘 생기 넘치는 도시 말이다.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들이 우리 도시를 자생력 있는 풍성한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존의 도시에 멋진 화음을 하나 더 쌓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