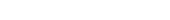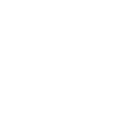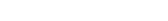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두 나라 돔(dome) 이야기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20.07.22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국회 홈페이지)
주기적으로 정부는 선거를 통해 바귀지만 한결같이 늘 시끄러운 곳은 대한민국 국회다.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혼란의 당쟁이 일어나는 그 공간은 어떤 곳일까. 통제된 닫힌 공간이기에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다만 대표적인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적 건축물이라거나 서양 고전디자인의 잘못된 차용이라는 등 많은 비판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의 국회, 즉 국회의사당 건축은 건축전문가들이 뽑은 최악의 현대건축물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국회의사당의 많은 건축적 허점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실책은 바로 지붕에 얹어진 청록색 돔(dome)이다. 이 돔이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알고 나면 누구나 답답한 마음을 감출 길 없을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1968년 서울 여의도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시작부터 관료들의 무지하고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삐걱거린다. 공모를 통해 복수의 건축가를 선정한 후 그들을 한데 불러 모아 공동의 안을 만들어 보라는 국회의원들의 명령이 있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설계공모 방식에 결국 안을 제출한 건축가 중 몇몇은 불참하고 나머지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초안을 제출했다.

△ 1968년 공모에서 선정됐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축 초안.(사진=마티)
눈에 보이는 안이 나오자 관료들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당시 공모에 참여한 안영배 건축가는 구술집(마티, 2013)에 당시의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했다. 국회의원들은 초안을 보고 “의사당이라 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큰 톰이 있어야지. 여긴 왜 돔이 없냐?”라고 말해 건축가들을 절망시켰다는 구절이 나온다. 느닷없는 유럽양식의 도입에 건축가들은 반대했고, 일부러 다음 회의에서 돔을 거대하게 설계해 비례에 맞지 않는 안을 만들어 거부감을 유도하려 했다. 문제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 안을 보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건축가들은 이같은 국회의사당 돔은 공허한 권력의 기념비이자 권력자의 교양없는 횡포라는 회고를 남기기까지 했다.
반면 같은 돔을 갖고 있지만 정 반대의 의미를 생산하는 국회의사당이 있다. 독일 국회의사당이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국회의사당의 중앙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모를 실시했고 영국의 건축가 노먼 포스터 사무소(Poster and Partners Architects)의 안이 당선됐다. 당선안은 그대로 실현됐는데 건축가는 전소되기 전 돔의 형상을 그대로 복원하면서 내부의 공간과 외피의 의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안했다.
신설된 돔은 전통양식을 형태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재료는 투명하게 했고 내부 벽면을 따라 나선형 계단을 설치했다. 애초에 독일 국회의사당은 시민들의 출입이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든 국회의사당의 가장 높은 곳인 돔에 올라 나선형 계단을 돌아 오르내리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현장을 자유롭게 지켜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투명한 외피를 통해 외부에 전시함으로서 국회의원들이 항상 시민들의 감시하에 있음을 건축적으로 은유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 독일 연방의사당의 전경과 돔 내부. 시민들은 의회를 내려다보며 관찰할 수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공권력의 구동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앞선 건축은 국민이 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이 피 감시자가 아닌 감시자의 위치에 놓이는 공간구조인 것으로, 이런 공간을 통해 시민의 권력은 공권력의 근본이자 상위의 개념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독일 국회의사당의 돔은 공권력의 상징이 아닌 시민권력의 상징으로서 탈권력의 건축이라 불릴 만 하다. 공공건축, 그 중에서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축이 탈권력의 행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건축을 통해 허황된 권력의 힘을 보이려 했던 여의도의 집착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우리의 국회는 아직 민주주의의 장이 아닌 다툼과 혐오의 장으로 여겨진다. 국민들에게 특권과 반칙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 삼엄한 경비 속에 섬 속의 섬이 돼 있다.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공간의 속살을 내 보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 필자는 독일의 돔을 여의도에 얹어 보는 상상을 해본다. 권력의 밀실(密室)을 소통과 봉사의 공간으로 누구든 와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탈권력의 공간으로 우선 바꿔 버리는 상상을 말이다. 공간을 채운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바뀌어 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