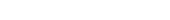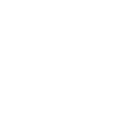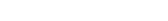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영화와 공간
- 현창용의 공간·공감
2020.12.16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천만 관객을 넘어 역대 누적 관객 수 3위를 기록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건축가의 시각으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공간’에 있었다. 영화 속에서 현실 세계의 공간은 극히 적은 양으로 다루어지고, 대부분이 시각특수효과(VFX)로 구현되었는데, 수치적으로도 영화 전체의 공간 장면 중 88%에 해당한다고 하니 사실상 가상공간에서 만들어 낸 영화라 할 수 있겠다.
전문가를 제외하면 영화에서 ‘공간’에 주목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배경’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만큼 공간은 영화를 이루는 많은 요소 중 가장 피동적인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보아온 영화들을 다시 곱씹어 본다면 공간이야말로 관객과 시나리오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품, 조명, 지나가는 단역배우마저도 철저히 계획된 영화의 공간은 그 순간의 영화적 암시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신과 함께’ 역시 마찬가지다. 7개 저승이 연속되는데 실존하지 않는 ‘저승’이란 공간이지만, 영화에서 표현하는 저승 공간들의 성격을 추적해 보면 등장인물과 사건 없이도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지옥 공간은 각 공간의 특성으로 ‘처벌’의 종류를 상징하고 있고, 인간이 생애 동안 범할 수 있는 ‘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대승적 메시지는 결국 공간들만 유심히 관찰해도 짐작할 수 있다. 영화의 전제는 공간의 전개만으로도 이해되고, 공간들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전제 위에서 일어나는 상징적 사례일 뿐이다.

△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 스틸 이미지 / 살인지옥

△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 스틸 이미지 / 나태지옥

△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 스틸 이미지 / 폭력지옥
건축가들은 흔히 ‘공간(space)’과 ‘장소(place)’를 구분해 말하길 즐긴다. 공간이 객관적이라면 장소는 주관적이다. 공간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장소는 서사적인 것이다. 어디에나 ‘공간’은 있지만, 나만의 ‘장소’는 흔치 않다. 공간에 개인 혹은 집단의 고유한 기억과 감성이 담길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 집 앞 놀이터는 늘 무심코 지나치는 어른에겐 단지 공용 ‘공간’일 뿐이지만 며칠 전 이사 간 친구와 함께 그곳에서 뛰놀던 기억을 가진 아이에게 이곳은 추억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영화에서의 공간들은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수많은 관객에게 ‘장소’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실존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영화 속 공간은 특별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과 함께’의 지옥들도 마찬가지다. 영화의 공간들을 돌이켜 보면 주인공이 각 지옥의 공간을 넘나들 때 공간끼리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전혀 묘사되지 않는다. 주인공은 각 지옥 안에서 걷고 뛰고 떨어지고 헤엄치지만, 다음 지옥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위한 어떠한 공간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연계되지 않은 공간들, 실제 공간이라면 건축가의 실책이 될 일이지만 영화적 공간을 설계하는 감독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 파편화된 텅 빈 표피에 불과했던 공간은 영화에 몰입해 각자의 삶을 회상하며 반추하고 있는 관객에겐 이미 저마다의 감성이 발생하는 ‘장소’가 돼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만드는 이는 영화의 공간이 누군가의 기억이 되길, 관객 저마다의 ‘장소’로 가슴속에 간직되길 바랄 것이다. 짐작건대 실패한 시나리오는 배경이 되는 공간을 그저 ‘공간’에 머물게 하고, 좋은 시나리오는 그 공간을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수반한 ‘장소’로 다가가게 할 것이다. 감명 깊었던 영화를 떠올리며 혹은 또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된다면 스크린에 끊임없이 지나가는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라. 어쩌면 뜻밖의 순간 스쳐 가는 영화의 한 배경이 나만의 ‘장소’가 돼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