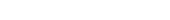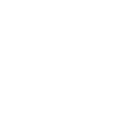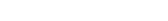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길, 권력, 공간
- 현창용의 공간, 공감
2021.06.25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2017년 6월 26일,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됐다. 서울 종로구 팔판동 삼거리에서 효자동 삼거리까지 경복궁과 청와대 사이의 유일한 도시공간인 청와대로가 49년 만에 문턱을 낮춘 것이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전면 통제됐고 그로부터 25년 후인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의 권위주의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조건부 통행이 허용돼 왔다. 개방되기까지 그로부터 24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던 셈이다.
이 길이 주변 5개소의 이동식 검문소마저 떼어내고 권위를 내려놓은 것은 물리적으로 경복궁 서편 효자동·창성동·통인동과 동편 팔판동·소격동·가회동 간 연결고리 회복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이 ‘구별 짓기’라는 권력의 변형된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청와대 앞길의 모습. ⓒ Imseong Kang
청와대 앞길의 개방이 갖는 이러한 상징성은 청와대라는 건축공간의 복잡한 사회사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정치사는 아주 큰 틀에서 왕정과 식민지배, 그리고 민주주의로 나뉜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 모든 체제변동을 겪어낸 격동의 역사 끝자락, 현대 대한민국의 지향점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정착에 있다는 점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주의를 향한 뜻깊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관적 차원에서 청와대라는 건축공간에 대한 논란은 아직 유효하다.
청와대가 경복궁 배후에 버티고 서서 근정전보다 북악에 가까이 기댄 채 입지적 위용을 과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디 경복궁 후원이자 왕의 친경지(親耕地)로 사용됐던 자리가 일제강점기 총독의 관저로, 일본의 패망 뒤 미국 군정 장관의 관저로, 결국 이승만 정부 때 경무대로 이름 바꿔 독재의 표상이 되어버린 사회사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결국 외세 권력에 의해 왜곡된 ‘정치적 경관’을 우리가 계승해버린 꼴이 됐는데 그 앞길마저 닫아버리고 ‘눈에 보이나 닿을 수 없는’ 길로 만들어 버렸으니 시민들이 느꼈을 권력에 대한 거리감의 크기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전경. ⓒ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은 길을 통해 도시를 알아가고, 도시는 길을 통해 사람에게 말을 건다. 우리는 길을 통해 시야에 잡히지 않는 도시의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며 ‘내가 살아가는’ 사회공간과 소통할 수 있기에 길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동네 작은 골목길 하나일지라도 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사회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과거 권력 공간과 현재 권력 공간 사이를 가로지르는 청와대 앞길의 개방은 공간을 통한 탈 권력과 나아가 민주사회 시민들의 공간 주권 회복을 상징할 만한 시도다. 이제 그 길에서 시민들은 더 감시의 ‘대상’이 아닌 상징적 ‘주체’로 존재할 것이기에 그러하다. 길 하나가 열렸을 뿐이지만, 그 열림이 만들어 낸 경험은 그 자체로 시민들의 주권 실행을 공간적으로 상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도 열린 사회라 불릴 만한 도시에서 살아갈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