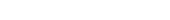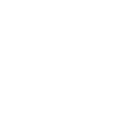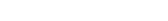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공항의 미학
- 현창용의 공간, 공감
2021.07.27
※ 이 글은 이데일리에 기재된 글입니다.

코로나 이전 공항은 매년 이맘때쯤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던 공간이자 가장 많은 설렘이 담기는 공간이었다. 공항으로 향할 때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세계에 대한 설렘, 치열했던 생활공간으로부터의 탈출, 국경을 넘는 관문, 그리고 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불안함 등은 공항이라는 공간만이 선사하는 복잡한 감성이다. 벗어나고 싶은 곳, 그러나 결국 돌아와야 하는 곳. 그 경계에 놓여있는 것이 공항이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저서 ‘여행의 기술’ 출발 편에서 공항이 주는 미묘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역설적이게도 여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떠나기 직전의 공항일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여행은 출발 전 설렘을 품은 상상 속 여행일지 모른다. 상상 속 여행에서는 불편한 언어도, 달라진 물과 음식도, 계획과 예산을 맞추려 머리를 쥐어뜯을 일도 없다. 여행에 대한 욕망은 ‘떠남’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떠남’을 안내하는 곳, 공항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 공항이 주는 감성의 이면엔 건축이 있다. 단순히 거대하고 기능적인 건축물 너머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건축적 장치들이 여행객들의 여행길을 더욱더 즐겁게 해준다.
먼저 공항은 ‘규모의 건축’이다. 공항은 우리가 쉽게 접근 가능한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의 ‘수평적 공간’을 창출한다. 수많은 여행객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공항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 기둥의 수를 줄이는 것이 구조적 기술의 핵심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기둥 없이 만들다 보니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견하기 힘든 독특한 형태의 뼈대가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비일상적 공간에서의 낯선 풍경들은 여행의 감성과 맞아떨어져 떠나는 날의 기대감을 배가시킨다.

공항은 ‘단위의 건축’이기도 하다. 단위(module)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규격을 의미하는데 알파벳 혹은 숫자로 된 번호판을 나눠 달고 줄지어 선 카운터들과 게이트들은 그 단위의 반복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동선과 공간을 제공한다. 물론 거대 공간에서 효율적인 수속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라운지를 거닐 때 느껴지는 반복적인 리듬감과 그 틈에서 타인이 여행하는 순간을 발견하는 것은 질서의 미학이라 불릴 만하다.

이와 함께 공항은 ‘재료의 건축’임을 빠뜨릴 수 없다. 출발(departure)을 위한 공간은 풍부한 빛과 환한 색채의 배경을 선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된 석재로 마감된 바닥은 여행용 가방이 미끄러지듯 나아가기에 안성맞춤이다.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여행객의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드는 건축적 요소이다. 그리고 아쉬움을 안고 긴 비행을 마친 이들을 위해 대부분의 도착(arrival) 라운지는 부드러운 카펫과 따뜻한 목재로 마감돼 있다. 여행은 돌아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귀국의 피로를 어루만지기 위한 공간의 배려다.
건축과 건설은 다르다. 건설이 물리적, 경제적 차원이라면, 건축은 사람과 행위의 차원이다. 작게는 지역, 크게는 국가 간을 넘나드는 방문자들에게 공항이라는 공간은 그 나라의 건축적 정체성, 즉 사람을 담아내는 공간에 대한 태도를 표방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여행을 하면서 공항을 찬찬히 살펴본 기억이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크다’ 혹은 ‘멋지다’라는 생각으로 지나쳤던 공항의 공간에서 한 번쯤은 눈 앞에 펼쳐진 건축의 미학에 마음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