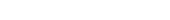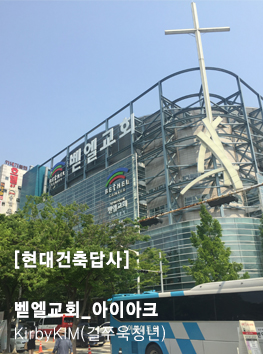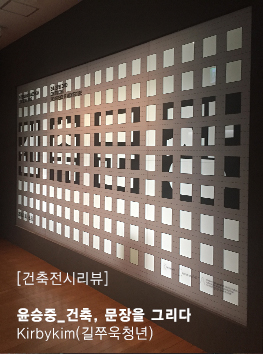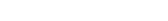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전통건축답사] 선교장
- 건축답사_선교장_강원도 강릉
2016.03.12
일반에게 개방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찰이나 서원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가옥의 답사를 강릉의 선교장을 통해 해보게 되었다. 마치 학창시절 영어단어를 외우듯이 내 머릿속에는 강릉과 선교장이, 강릉 선교장이라는 하나의 문구로 남아있다. 아마도 대학생 때, 한국건축사라는 수업을 통해 배웠던 전통건축의 사례들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때의 기억을 떠올려 선교장을 소개하자면, 선교장은 흔히 말하는 궁궐 밖 가장 큰 99칸의 집. 그만큼 가세가 좋았던 사대부 집안의 집이었고, 선교라는 이름은 과거에 집앞까지 닿았던 경포호의 다리를 건너야만 집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이다. (지금은 경포호의 크기가 많이 줄었기에 선교장까지 닿아 있지는 않다.) 현재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누구나 쉽게 들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활래정
매표소를 지나 처음으로 보이는 건물은 연못 위에 떠 있는 듯 자리한 활래정이다. 이름처럼 정자인데, 옛 집안의 남성 어른이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정자를 놓기 위해 커다란 인공연못과 인공섬을 만들어 눈앞에 자연의 풍경을 옮겨 놓은 것으로 보아 당시 선교장의 주인이 얼마나 실력가였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활래정 아래로는 온돌도 설치돼 있어, 추운 날에도 쓰일 수 있게끔 되어 있다. 활래정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면 인공섬 위에 심은 소나무 한그루가 보인다. 비록 인공의 환경으로 빚은 것이지만 앉은 자리에서 물과 나무, 바람 등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자들이 지니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일 것이다.
선교장
활래정을 지나면 아래와 같이 본격적인 선교장의 주거영역이 눈에 들어온다. 99칸이라는 규모에 걸맞게 긴 행랑채를 앞에 두고, 뒤로는 소나무가 가득한 언덕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다. 옛 모습을 떠올리면 집 앞으로는 물이 있고, 뒤로는 나즈막한 산을 등지고 있으니 참 아늑한 자리매김이지 않나 싶다.


선교장의 주출입구인 솟을대문을 보면 집에 규모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오는 손님을 마다하지 않는 집안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해석이 썩 와닿지는 않지만, 내 경험상의 다른 가옥의 솟을대문보다도 작고 아담한 것은 사실이다.

대문을 지나면 큰 마당을 끼고 있는 선교장의 대표 건물인 사랑채 열화당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전통건축에서는 마당과 남성과 여성영역의 구분이 가장 큰 특징인데, 사랑채(열화당)를 끼고 있는 이 마당은 사랑마당으로 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의 영역일 것이다. 이 곳에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손님을 맞이하며 집안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열화당은 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 받은 차양 양철지붕을 우리 한옥에 덧된 매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질적인 두 요소가 만났지만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라 그러한지 이제는 하나처럼 보인다.

덧된 양철지붕의 끝단처리는 기와를 닮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지붕의 재료만 이질적이지 똑같은 목재를 이용한 가구조이기에 잘 맞는다.
선교장 가옥배치의 큰 특징은 앞서 이야기한 대문을 지나 바로 보이는 사랑마당과 나란히 좌우, 가로로 길게 배치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아래 사진과 같이 각 영역을 구분하는 작은 문을 두고 마당과 마당이 옆으로 이어진다.

위의 작은 문을 지나면 안채와 다른 별채들이 자리한 안마당이 나온다. 사랑채인 열화당을 낀 사랑마당이 집안 어른이 있는 남성의 영역이었다면, 안채를 끼고 있는 안마당은 집안의 안주인이 자리한 여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부엌도 함께 있어 집안의 가사일을 모두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이 곳에는 동별당이라고 하여 별채가 하나 있는데, 집안 어른이 손님을 맞이하는 곳으로 쓰였다고 한다. 즉 앞선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대문을 지나 들어온 손님을 집안의 어른이 맞이하고 간단하게 담소를 나눈 뒤 동별당으로 자리를 옮기면 안채와 부엌에서 대접할 음식을 차리고 내어 식사와 다과를 가졌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을 통해 우리 전통가옥의 배치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따라 영역이 나뉘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공간이 배치되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각각의 영역은 확실히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배치의 특성상 아래와 같이 틈을 가지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 물론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의 역할로만 볼 수도 있겠으나, 공간을 나누지 않고, 닫지 않고 여는 우리 건축의 전반적인 특징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
사랑마당과 안마당 사이의 약간 뒷 공간에는 서별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곳은 할머니의 거처라고 한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안채를 내어주고 물러난 시어머니가 기거하는 곳인데, 그 때문인지 흔히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경사로가 있다. 이곳 역시 마당을 중심으로 공간이 펼쳐진다.


외관에서 보였던 행랑채는 위 사진과 같이 두개의 마당을 관통해 길게 놓여 있다. 이곳은 집안의 중요 인사들이 아닌 집안을 돕는 보조들의 주거공간과 곳간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도 대궐같은 주택의 행랑채인 만큼 정갈하고 깔끔한 건축미가 있다.

집의 뒷편에는 집안의 옛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별동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곳도 사랑채보다는 안채에 가까워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내어가기 좋은 자리에 있다.
선교장을 답사한 당시는 선교장 이외의 다른 가옥들을 수차례 보고 마지막으로 들른 시기었는데, 선교장은 여타 다른 가옥보다 훨씬 정갈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풍겼다. 물론 관리가 제일 잘 되었기 때문도 있겠으나, 내가 꼽는 다른 이유는 섬세함의 차이이다. 선교장 좀 더 가까이 세밀하게 바라보면 부재 하나하나, 요소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이 화강석의 기단과 나무, 벽돌의 부재가 만나는 부분도 최대한 섬세하게 깎고 잘라 맞췄고,


구들장을 가리는 벽돌도 쌓기를 달리해 십자모양으로 기교를 내었다.

옛것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빗살로 무니를 낸 기와. (위사진)
선교당의 답사기를 통해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건축이 지닌 건축적 기교가 아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택은 더욱 그러하다. 삶의 방식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이다.
즉 정리하면 선교장을 비롯한 우리 전통가옥들이 세워질 당시의 우리나라(조선)의 문화는 유교문화이다. 그로 인해 주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되고, 상하의 관계가 명확해졌다. 선교장 답사를 통해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그 원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 마당을 두고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만드는 우리 건축의 구축론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포스팅이 우리 전통 건축을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 공감이 되길 바라본다.

선교당 배치 사진 (출처 : 선교당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