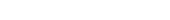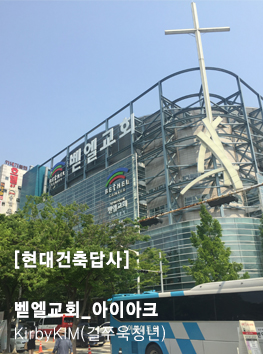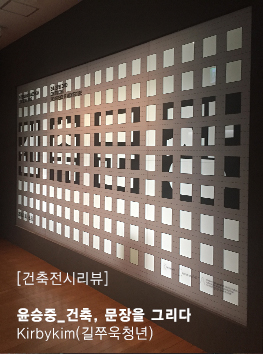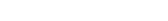- [전통건축답사] 담양 소쇄원 / 영양 서석지
- 건축답사_담양 소쇄원 / 영양 서석지_정원
2016.05.20
현재 에이플래폼에 포스팅된 내 전통건축 답사기는 병산서원과 선교장 두가지가 있다.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현대건축답사, 전통건축답사, 전시리뷰의 카테고리를 분류하면서 나름 골고루 분배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했는데, 항상 전통건축답사기를 올리려는 순간 머뭇거리게 되었다. 현대건축답사기야 나름 실무를 한 기간동안 익힌 것, 본 것, 주워 담은 것이 있어 둘러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데에 부담이 덜 한데에 반해 전통건축답사기는 그렇지 못하다. (전시회 리뷰도 현대건축답사와 마찬가지로 부담은 덜하다)
전통건축이라고 생각하면 현대건축보다는 한층 더 어렵게 여겨지고, 내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흔히 현대건축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재료, 마감, 디테일 등의 이야기를 전통건축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난다. 나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분석? 관찰?은 전통건축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두개의 전통건축을 가지고 좋은 장소를 소개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내어놓고자 한다.
포스팅하고자 하는 대상은 Archur 님의 정신의 '피접' 포스팅에서 처럼 최근 피접을 위해 떠나 둘러보고 온 담양 소쇄원과 그 이전의 피접을 위해 떠났던 영양 서석지이다. 두 건축물아니 장소를 하나의 포스팅으로 묶은 것은 두 대상 모두 우리의 정원건축에 속하면서도 서로 다른 멋을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담양 소쇄원
소쇄원은 건축가 혹은 건축을 전공한 이라면 모르지 않고, 한번쯤을 다녀와 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전통건축물이다. 그런 소쇄원을 책과 사진으로만 보고 떠들던 것이 스스로가 창피해 최근에 있었던 연휴를 틈타 다녀오게 되었다. 우리 최고의 정원건축 더 나아가 최고의 전통건축으로 꼽히는 소쇄원의 느낌을 전해보고자 한다. 연휴였던 지라 수많은 인파가 개인적인 기대를 저버리게 하였지만, 최선을 다해 공간을 느끼고자 노력했다.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숲은 걸작을 만나기 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걸었던 동선과 시선 순서로 정리하여 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장면은 아래사진과 같다. 분명 인공적인 축대와 구조물로 세워진 광풍각이지만, 주변의 자연의 무성함에 묻혀 자연과 하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책에 쓰여지는 미사여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앞의 계곡과의 거리감? 조화로움?은 마치 지금 바라보는 자리에서의 풍경을 고려한 것마냥 절묘하다.


입구라고 쓰여있지 않으면 전혀 입구 같이 않은 그저 담벼락의 끝. 소쇄원을 안과 밖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담은 소쇄원을 이루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그것은 경계짓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눈높이 아래로 엉성하게만 존재한다. 입구를 의미하는 문이 없는 것도 원형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성격의 연장이 아닐까.

소쇄원의 백미 중 하나인 계곡을 배려한 담의 모습 (위, 아래) 자연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대단히 노력한 담벼락의 모습을 보며 담을 쌓던 이의 감정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났다.
사실 담을 보며 흐르는 물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였더라면 물이 있는 부분에 쌓지 않는 것이 더욱 취지에 맞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나무를 만난 담은 돌아가지도 않고 끊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불손하게 생각하면 보여지는 모양새가 특이하고 재치 넘쳐 과대하게 포장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견이 있다면 한 번 들어보고 싶다.
제월당으로 향하기 전의 또 한번 전경을 보았을 때, 여지없이 모든 것은 숲에 덮여 있다. 자연 속에 묻혀 있다.

소쇄원에 있는 몇 안되는 건물 중 주인의 방 역할을 했던 제월당.
'비 갠 뒤 달'이라는 뜻의 집인데, 사실 그 모양새나 구성은 흔히 보던 전통건축들과 다르지 않다. 도산서당과도 유사하다. 지난 전통건축 답사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었는지는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우리 전통건축을 생김새로써 그 차이를 찾으려 애쓰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신 그 집에 걸린 현판의 이름을 통해서는 그 집의 성격이 명확히 달라지긴 한다. 이 집의 이름이 제월당인 것은 주인이 이 시골 산자락에 내려와 비가 개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편히 쉬고 싶어하는 집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집의 성격은 그렇게 정의된다. 내가 소쇄원을 방문했을 당시, 문화해설가로 계시던 어느 할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 이 제월당에서 김수근씨가 한참을 머물다 갔었다고 한다. 죽을 병에 걸렸을 당시에도 소쇄원에서 며칠만 머물렀으면 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떠나 김수근 건축가 역시 이곳에서 옛 주인이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소쇄원의 사랑방이었던 광풍각. (아래)
제월당과 마찬가지로 광풍각 역시 비온 뒤 개면서 비추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자연을 한 껏 느끼고자 했던 주인의 마음이었는지 가운데 한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은 모두 마루로 돼 있어 걸터 앉아 있으면 자연 한복판에 앉은 느낌을 준다.



바로 앞으로 흐르는 계곡과 너머 보이는 산, 연못은 자연이라는 단어 밖에 떠오르지 않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소쇄원의 가장 중요한 장면. (개인적으로) 자연 안에 묻혔다는 말을 다시 한 번 하게 만든다.

영양 서석지
전라도 담양에 위치한 소쇄원, 공교롭게도 반대인 영남 지방에 위치한 영양군에 있는 서석지는 소쇄원과 마찬가지로 정원건축의 하나이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사실 소쇄원 만큼 대중적이지는 않아 생소할 수 있는데, 나 역시 알게 된 것도 우연히 본 유홍준씨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통해서였다. 사실 찾아가기도 쉽지않은 시골에 있어 선뜻 방문하기가 어렵지만 들르면 기대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 소쇄원보다는 덜 유명한 서석지를 위해 자세한 설명은 안내판으로 대신한다.

소쇄원은 드넓은 자연 속에 놓여진 것이 특징인 데 반해, 서석지는 소쇄원과 같이 개인의 정원이기는 하나 주택 안에 있는 잘 꾸며진 정원이다.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경정(위)이라고 하는 정자가 보이며 그 앞의 인공연못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서석지이다. 원래 전통건축의 주택으로 치면 마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연못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 당시 물이 말라 있기는 했으나, 상당히 깊은 못임을 알 수 있었고, 가운데 사우단이라는 단을 두어 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 네 종류의 식물을 심어 바라 볼 수 있게 하였다.




경정에 앉아 서석지를 바라보면 바로 눈 앞에 작은 자연이 옮겨 온 느낌을 받는다. 소쇄원을 갔을 때와는 달리 아무도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매우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소쇄원의 그 장대한 자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지만, 자연을 앞에 두고 여유를 즐기려 했던 주인의 마음은 같지 않았을까..



마무리
사실 소쇄원과 서석지를 병치한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소쇄원을 방문했을 당시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서석지였다. 내 경험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면도 있겠으나, 서로 다른 정원으로서의 두 곳의 차이가 나에겐 흠이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방대한 자연에 건축물을 절묘하게 배치하고 공간을 가두듯 가두지 않아 한아름 품은 소쇄원, 이미 정해진 규모의 주택 안에 갖가지 자연요소를 하나하나 작게 모아 담은 서석지. 자연을 다룬 태도가 서로 다르나 두 곳 모두 우리 전통 건축이며, 우리의 정원이다.
서석지 역시 최고의 민간정원이라고 평가했던 유홍준씨의 글을 떠올리며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두는 것만이 우리의 건축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진정한 우리의 건축(정원)에 대한 정의도 생각해본다.